딱따구리가 머리를 쪼는 느낌.. 국내 편두통 경험자 709만명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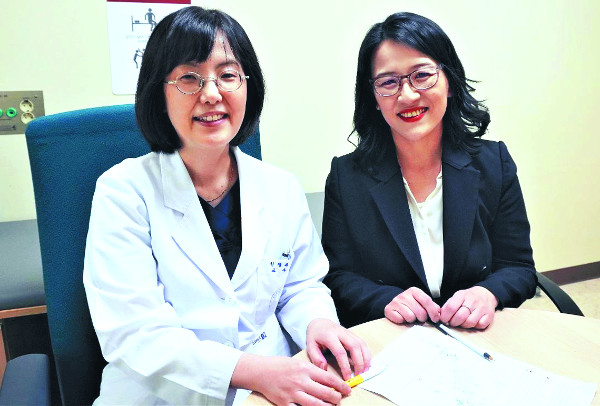
어렵사리 편두통 진단을 받은 최문경씨(오른쪽)가 주치의 오경미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와 질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대한두통학회 제공
주부 최문경(40)씨는 7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소화불량과 두통으로 소화제와 진통제를 달고 살았다. 10대 이후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녀를 괴롭히던 두통은 둘째를 낳고 나서 더 잦아졌다. 속이 불편한 증상도 심해졌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증상이 시작되면 몇 시간씩 또는 하루종일 어두운 방에 눈을 감고 누워 있어야 했다. 밝은 빛이나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졌고 특히 TV소리는 듣기도 싫었다. 생리주기의 영향을 받는 듯해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처방받아 먹기도 했다. 그때까지는 소화불량이 두통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그러다 2017년 어느 날 출근길에 큰 낭패를 당할 뻔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메스꺼움을 느껴 구토가 나오려 했던 것. 황급히 내려 역 화장실로 달려가 해결했지만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최씨는 소화기내과도 산부인과도 아닌 신경과에서 ‘편두통’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편두통이 소화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일찍 알았더라면 고통을 오랫동안 겪지 않았을텐데 아쉬움이 컸다”고 했다. 최씨는 이런 경험담을 에세이에 담아 대한두통학회가 두통의 편견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최근 진행한 ‘제2회 두통 이야기’ 공모전에 응모했고 대상을 받았다.
주치의인 오경미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교수는 9일 “구역질과 구토 같은 소화기 문제는 편두통 환자가 겪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편두통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구역질, 2명 중 1명은 구토를 경험한다”면서 “편두통은 일반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 질병 정보가 부족한 탓에 다른 병으로 오해하거나 일반 진통제로 버티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씨 역시 소화불량 때문에 두통이 온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데 4년이 걸렸다. 최씨는 “소화불량과 두통을 동시에 호소하는 환자들이 약국에 올 때 약사들이 신경과 진료를 한 번 받아볼 것을 권고하거나 내과, 산부인과 의사들도 편두통 가능성을 언급해 주면 만성 편두통 환자들이 답 없이 헤매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진단까지 평균 10년 걸려
편두통은 이처럼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비율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편두통 진료 환자는 56만7000여명으로 여성(40만4000명)이 남성보다 약 2.5배 많았다. 30~50대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30만8000여명)을 차지했다. 2015년(50만6000여명)과 비교해 편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유병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는 평가다. 오 교수는 “두통학회가 조사한 편두통 성인 유병률은 16.6%로 국내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709만명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환자들은 자신이 편두통을 갖고 있는지 모르거나 일반 진통제로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회 조사결과 편두통을 진단받기까지 평균 10.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라 생각하지만 편두통 증상은 복잡하고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검사로는 확인되지 않아 전문가가 아니면 진단이 쉽지 않다. 한쪽 머리 통증이 있는 편두통 환자는 40%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양쪽 두통과 함께 소화불량, 구역질, 구토 등 증상을 동반한다. 일부는 빛이나 소리에 의해 두통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어둡고 조용한 곳에 있으려는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을 겪기도 한다. 또 20% 환자는 두통 시작 전에 사물이 왜곡돼 보이거나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번쩍거리는 증상, 감각 이상, 발음장애 등이 나타나는 ‘조짐 편두통’을 경험한다.
편두통 환자의 두통은 4시간에서 길게는 3일까지 지속되며 주로 두근거리는 박동성의 양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본인의 두통을 ‘머리 속에서 심장이 뛰는 느낌’ ‘머리를 박자에 맞춰 밀가루 반죽하는 느낌’ ‘딱따구리가 머리를 쪼는 느낌’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가장 흔한 형태의 ‘긴장형 두통’은 조이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된다.
편두통은 뇌신경과 혈관이 통증에 예민해지면서 나타나는 뇌질환이다. 민감한 뇌는 유전적 영향이 커 편두통 환자의 70%는 가족력이 있는 걸로 보고된다. 최씨 역시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어머니는 머리가 아프다며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다. 나처럼 편두통으로 힘들어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밖에 적포도주나 치즈 같은 특정 음식이나 약물을 먹거나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나 피로, 잘못된 자세에 의해 편두통이 비롯된다는 것은 오해다. 이는 ‘긴장형 두통’의 원인이다.

우울증 등 동반, 삶의 질 낮아
편두통은 긴장형 두통 보다 통증이 심하고 동반 증상이 있다보니 환자들의 삶이 열악한 편이다. 지난해 학회 조사에서 편두통 환자들은 한 달에 4일 이상 두통으로 학습이나 작업 능률이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증상이 심해 결석, 결근한 적도 한 달에 하루 꼴로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 환자는 편두통으로 인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오 교수는 “편두통은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지만 환자들은 두통이 시작되면 일상생활을 거의 수행할 수 없을 정도다. 증상이 심한 이들은 편두통이 없는 날에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편두통 환자에게 우울증이 동반될 경우, 약물 순응도가 떨어져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은 두통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두통이 가끔 찾아오고 일반 진통제로도 증상이 해소된다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 달에 8번 이상 두통이 반복되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지속되고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정확한 신경과 진단과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잦은 편두통을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일상을 편두통과 함께 살아야 하는 만성 편두통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다.
편두통 치료는 두통이 나타날 때 통증을 빠르게 없애주는 급성기 치료와 두통의 횟수 및 강도를 조절해 주는 예방적 치료로 이뤄진다. 예방 치료의 경우 두통이 자주 나타나거나 심한 환자에 한해 권장된다. 예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약제를 달리 해야 하거나 부작용의 한계가 존재했지만 최근 편두통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신경전달물질(CGRP)을 직접 차단하는 약물이 나와 치료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